티스토리 뷰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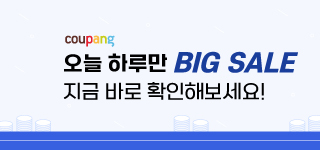

CBDC가 본격 도입되면 시중은행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쏘는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① 문제 제기: 디지털 화폐 시대, 은행의 존재 이유는?
카카오페이로 돈 보내고, 토스뱅크로 대출받고, 증권사에서 CMA 통장까지 개설하는 요즘.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굳이 은행이 필요한가?”
여기에 CBDC까지 등장하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돈을 발행하고, 국민에게 바로 지급까지 한다면...
중간에 있던 시중은행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② 핵심 개념 설명: 기존 은행 시스템 vs CBDC 구조
기존에는 이렇게 돈이 흘렀죠.
중앙은행 → 시중은행 → 국민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이 예대금리 조정해서 적용)
그런데 CBDC가 도입되면?
중앙은행 → 국민
(시중은행 생략)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판을 뒤흔드는 구조 변화입니다.
은행의 기존 역할
- 예금/대출 기능
- 지급결제 중개
- 신용 평가 및 리스크 관리
CBDC 시대에는 이런 역할 중 일부가 중앙은행 + 기술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③ 구조적 흐름 설명: CBDC가 은행에 미치는 3가지 영향
1. 예금 기능 약화
사람들이 굳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에 직접 보관한다면?
→ 시중은행의 예금 유치 능력이 약화됩니다.
→ 이는 곧 대출 자금 여력 감소로 이어지고,
→ 민간 대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요.
2. 지급결제 시장 재편
지금은 계좌 이체, 카드 결제, 간편결제 등 대부분 은행을 거칩니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되면?
→ 중앙은행이 직접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
→ 토스나 네이버페이처럼 빠르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저렴
결과적으로 은행의 결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은행의 역할 변화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 CBDC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을 자체 개발
- CBDC 지갑 연계 서비스로 신사업 확장
- 기업·고위험 대출 시장 특화 등 틈새 시장 공략
즉, 은행도 기술 회사처럼 변신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④ 실생활 적용 + 예시
사례 1. “이제 돈은 정부 앱에서 받습니다?”
예전엔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시중은행 계좌나 카드가 필요했죠.
앞으로는 중앙은행의 CBDC 앱만 있으면 바로 지급됩니다.
→ 은행 없이도 돈을 주고받는 시대, 정말 열릴 수 있어요.
사례 2. 은행 대출이 줄어든다면?
은행이 예금을 못 끌어오면 대출 여력도 줄어듭니다.
그럼 누가 대출을 해줄까요?
→ 정부 정책 금융 확대
→ 핀테크 기업의 중금리 대출 시장 진입
→ 이자율 구조나 승인 기준도 바뀔 수 있어요.
사례 3. 기업은행, 지방은행은 더 힘들어진다?
CBDC 인프라는 전국 어디서든 동등하게 제공됩니다.
그럼 물리적 점포 기반이었던 지역은행, 지방은행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⑤ 요약 정리 + 감성 마무리
- CBDC는 금융의 중개 구조를 단순화시킵니다.
- 시중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예금, 결제, 대출)은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 은행은 이제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기업으로의 진화가 필수입니다.
은행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주거래 은행', 10년 후에도 지금 모습 그대로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