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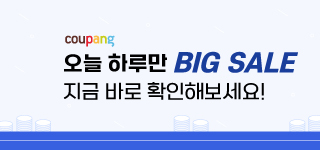

CBDC가 도입되면 정부가 개인 소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을까? 디지털 화폐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파헤쳐봅니다.
① 문제 제기: 디지털 돈, 편한 대신 감시도 따라온다?
토스에서 커피 사고, 배달앱에서 저녁 주문하고, 간편결제로 친구한테 용돈 보낼 때...
우린 이미 일상적으로 '추적 가능한 돈'을 쓰고 있죠.
근데 여기에 CBDC까지 도입되면?
“이제는 정부가 내 지갑 속까지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그냥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만한 변화일까요?
② 핵심 개념 설명: CBDC, 왜 추적 가능성이 나올까?
CBDC는 디지털로 존재하는 화폐입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 구조예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 민간 기업 운영, 정부는 접근 제한
- CBDC = 중앙은행(=정부) 직접 발행 및 관리
즉, 기술적으로 보면 정부가 모든 결제 내역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래 익명성의 변화
| 익명성 | 높음 (거래 추적 불가) | 제한적 (민간 보유) | 낮음 (정부 발행·기록 가능) |
| 추적 가능성 | 매우 낮음 | 중간 | 매우 높음 |
③ 구조적 흐름 설명: CBDC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3가지 경로
1. 거래 기록의 중앙 집중화
현금은 사용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CBDC는 누가, 언제,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기록됩니다.
→ 이 정보가 중앙은행 시스템에 저장되면
→ 정부가 개인의 소비 내역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
2. 조건부 사용 제어 가능성
CBDC는 프로그래머블 머니입니다.
즉, 특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 돈은 30일 안에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
→ 유용한 기능 같지만, 뒤집어 보면 **“정부가 돈의 쓰임새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3. 압수, 동결, 차단이 쉬워진다?
기존에는 계좌 압류나 압수엔 법원의 결정이 필요했죠.
하지만 CBDC가 법정화폐가 되면, 기술적으로는
정부가 명령 한 줄로 특정 개인의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④ 실생활 적용 + 예시
사례 1. 재난지원금이 정부 앱으로 자동 지급
장점: 빠르고 투명하게 지급됨
우려: "어디에 썼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
→ 이게 복지 효율 향상일까, 과도한 감시일까?
사례 2. ‘조건부 현금’의 등장
-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CBDC 20만 원, 전통시장 한정 지급”
- 유흥업소,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 불가
→ 효율적인 재정 집행일 수 있지만,
→ 반대로 말하면 “내 돈인데 어디 쓸지 제한 받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례 3. 사회적 신용 시스템 우려 (중국 사례)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 도입하면서
개인의 신용점수, 구매 내역 등을 연동해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 정부 비판자,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디지털 화폐 사용 제한 사례도 보고됨
→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도입될 수 있을까요?
→ 현재는 아니지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합니다.
⑤ 요약 정리 + 감성 마무리
- CBDC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화폐지만,
- 정부가 개인의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 결국 핵심은 ‘얼마나 익명성을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통제를 견제할 것인가’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돈, 그게 정말 내 돈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허락받은 돈’일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돈의 기술적 진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중입니다.

